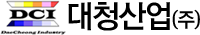[최희정의 ‘불현듯’] 평양냉면의 계절
작성자
날짜
2022-06-03
조회수
210
어릴 때 냉면은 특별한 음식이었다. 요즘처럼 전문식당에 가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여름날 어쩌다 한 번 집에서 해 먹는 음식이었다. 우리 집에서는 퍼런 비닐 포장에 들어있는 청수냉면을 사다 먹었다. 몇 해 전 마트에서 이 냉면을 발견하고 반가웠다.
..
무더위가 계속되는 여름날 저녁 엄마는 큰 솥에 면을 삶으셨다. 비닐 포장지에 담겨있던 뻣뻣한 면을 물이 펄펄 끓는 솥에 넣고 휘휘 젓다가 면이 부드러워지면 큰 소쿠리에 건져 찬물에 헹궜다
육수는 요즘 라면수프처럼 가루로 된 것이 들어있었다. 큰 함지박에 여러 개의 수프를 탁탁 털어 넣고 물을 넣어 육수를 만들었다.
얼음은 요즘처럼 냉장고에서 얼린 각얼음이 아니었다. 얼음집에서 파는 덩어리 얼음을 사 왔다. 얼음집에서 커다란 얼음을 톱으로 썰어주었다
얼음에 바늘을 대고 장도리로 톡톡 치면 얼음이 잘게 잘렸다. 얼음 틀에 얼린 각얼음은 모양이 일정하지만 이렇게 잘라낸 것은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큰 것 작은 것이 섞이게 된다.
준비가 끝나면 대접에 삶은 면을 넣고 채 썬 오이와 토마토를 얹고 얼음 몇 개를 넣고 국자로 육수를 부으면 냉면이 완성되었다. 어른인 엄마,
아빠는 겨자와 식초를 넣어 드셨고 편식이 심했던 나는 오이채를 슬슬 밀어내면서 면만 건져 먹고, 앞니로 오이를 밀어내면서 시원하고 짭쪼름한 육수를 마셨다
요즘은 냉면 전문점에서 여러 가지 냉면을 판다. 슴슴한 국물과 부드러운 면의 평양냉면이 맛있다는 사람도 있고 쫄깃한 면과 매콤한 양념의 함흥냉면이 좋다는 사람도 있다
메밀의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평양냉면과 녹말의 쫄깃함이 도드라지는 함흥냉면을 비교해가면서 서로 취향을 견주는 즐거움이 있다. 마치 짜장과 짬뽕을 비교하는 것처럼.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에서 최초로 배달된 냉면을 떠올리며 사람들은 감격스러움을 나누었다. 평양냉면이 남북정상회담의 최고 수혜 물품이라고 할 정도였다.
만찬 당시 북한의 김 위원장이 “어렵사리 멀리서 평양냉면을 갖고 왔다”라고 말하고 곧이어 “아, 멀리 멀다고 말하면 안 돼갔구나”라고 덧붙였던 것이 기억난다.
그때는 많은 사람이 통일이 성큼 가까워졌고, 평양에 가서 냉면을 먹을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했다. 나도 그랬다. 그러나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지금, 과연 냉면 먹으러 평양을 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게 되었다.
다시 6월이다. 6월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달이다. 전쟁은 사람을 죽이고 또 죽였다. 땅속으로 애먼 목숨의 피가 스며들었다. 전쟁은 이산가족을 만들었다. 뿌리가 끊긴 사람들의 눈물이 땅에 흥건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는 아직 전쟁이 끝났다고 말할 수 없는 땅에 살고 있다. 그러나 평양냉면은 사람들과 함께 휴전선을 건너 남쪽에 와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어제 만난 지인은 평양냉면 마니아라며 서울에서 유명한 냉면집 이름을 줄줄 말했다. 우리는 서울에서 언제라도 평양냉면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평양에 냉면을 먹으러 갈 수는 없다. 냉면이 생각날 때 별다른 절차 없이 기차를 타고 평양에 가고 싶다.
그런 날이 온다면 엄마와 아들과 딸을 데리고 가야겠다. 전쟁을 겪었던 팔순 넘은 엄마와 마주 앉아,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끝났다고 우리 아들과 딸들은 더는 전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고명으로 얹어서 평화롭게 냉면을 먹고 싶다. 호록 호록 호로록